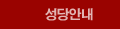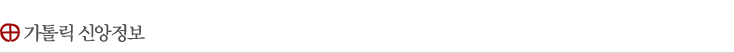
< 집 밖에서 성체를 기다리시던 신부님 >
1984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본당 발령을 받아 첫 보좌 신부 생활을
했을 때 가장 힘든 일은 매주 수천 명의 신자들 앞에서 강론을
하는 것이었다.
강론 준비도 어려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론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에게 힘든 일은
환자를 방문하고 봉성체(병자 영성체)를 하는 일이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성당을 출발해서 하루에 수십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면 어두워질 때도 많았다.
자동차가 없을 때니 걸어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날에는 자칫 점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환자들을 만나면
신비하게도 저절로 힘이 샘솟았다.
그런데 본당 구역 내에 십년 넘게 중풍으로 투병 중인 은퇴 신부님이
한 분 살고 계셨다.
그 신부님은 주위 도움이 없이는 걷거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하셨다.
처음으로 그 신부님 댁을 방문했던 날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신부님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앞에서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다음 달에도 계속 신부님은 밖에서 나를
기다리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신부님께 여쭈었다.
"신부님, 안에서 편하게 계시지 않고 힘드시게 왜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러자 신부님은 "한 달에 한 번 예수님을 모시는데 송구하게 집안에서
어떻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겠나?" 하고 환하게 웃으셨다,
그 말씀에 내 코끝이 찡해졌다.
그리고 그 신부님은 영성체 전에 항상 나에게 고해성사를 보셨다.
하늘같은 선배 신부님께서 햇병아리 새 사제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고해를 하셨다.
신부님의 고해를 듣고 짧게라도 훈계를 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죽을 맛이었다.
그런데 신부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내 훈계를
열심히 들으셨다.
진땀을 빼고 사제관으로 돌아올 때면 그분의 깊은
신앙심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봉성체 후에 신부님께서 나에게 힘겹게 말씀하셨다.
"허 신부! 난 요즘 밤이 되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느님께 원망을
많이 해. 고통이 참지 못할 정도로 심해지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싶을 정도야. 내가 고통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릴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허 신부가 미사 때 날 좀 특별히 기억해 줘. 요즘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외치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말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게나."
나는 그 신부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이다.
얼마 후 신부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신부님이 당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를 청하던 말씀이 많은 시간이 흘러간 지금도 내 마음의 메아리로
남아 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차지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우리의
영혼은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그런데 영원을 향한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만족할 수 없다.
세상의 가치는 늘 한계적이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은 절망과 자포자기의 늪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준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원한 갈망을 채워 주고
생명을 주시는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고통과 시련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사막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물이 있다. 나에게 와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샘물을 마음껏 마셔라!"
허영엽 신부님(서울대교구 홍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