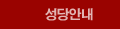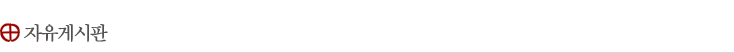
글수 1,055

피에타 / 케테 콜비츠
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안고 있다. 아마 그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을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피에타>라는 주제를 인류에게 제시한 후,
이것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어머니들의 영원한 주제가 되었다.
어쩌면 캐테 콜비츠의 <피에타>도 그 슬픔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바리에이션 중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저 하나의 바리에이션에 불과한 작품이 어떻게 그렇게 단 한 번에,
단 몇 초만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90년인가.
나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유리벽 속에 보호되어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별다른 감동이 없었다.
그러나 캐테의 <피에타>는 달랐다. 통한의 어머니와 죽은 아들의 형상을 담은
그 작품은 여성의 동물적인 모성애를 통곡처럼 보여 주고 있었다.
저토록 무시무시한 것을 만들어 내다니.
여기서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는 아마 케테 콜비츠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양대 세계대전에서 아들과 손자를 차례로 잃었다. 전쟁의 희생자가 된
이 두 젊은이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모두 페터였다.
아침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눈을 떴다. 페터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어린 것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다. 공연한 걱정이 아니다.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문화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청년기를 계속 알차게 보내야만 하는데.... 하지만 페터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다. 이 소년의 마음을 돌려놓을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남편이 그에게 말했다. "조국은 아직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벌써 불렀을 거야." 그러자 페터가 대답했다. "조국이 내 나이 또래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나는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나는 일어섰다. 페터가 뒤따라왔다.
우리는 문가에 서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도
페터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순간.
이 어린 것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다. 공연한 걱정이 아니다.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문화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청년기를 계속 알차게 보내야만 하는데.... 하지만 페터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다. 이 소년의 마음을 돌려놓을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남편이 그에게 말했다. "조국은 아직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벌써 불렀을 거야." 그러자 페터가 대답했다. "조국이 내 나이 또래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나는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나는 일어섰다. 페터가 뒤따라왔다.
우리는 문가에 서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도
페터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순간.
케테 콜비츠는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어미의 처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페터는 기어코 전쟁터로 떠났다.
1914년 10월 10일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케테는 전선의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단 한 마디 "포성을 들으셨겠지요?"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엿새 후인 1914년 10월 30일, 그녀는 전문 하나를 받았다.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후 케테의 일기는 아들에 대한 통한의 눈물로 가득 차 있다.
어미의 처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페터는 기어코 전쟁터로 떠났다.
1914년 10월 10일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케테는 전선의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단 한 마디 "포성을 들으셨겠지요?"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엿새 후인 1914년 10월 30일, 그녀는 전문 하나를 받았다.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후 케테의 일기는 아들에 대한 통한의 눈물로 가득 차 있다.
페터야. 이 독일의 젊은이야. 얘야. 사랑스런 나의 아들아. 네가 그렇게
황급히 떠난 지도 두 달이 되었구나. 나의 페터야. 나는 계속 너의 뜻에
충실하련다. 너의 뜻이 무엇이었던가 잊지 않고 지켜가련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그것은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일이다. 네가 너의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했듯이 나도 나의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하련다. 나는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참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 나의 페터야. 제발 내 곁에 머물러 다오. 나에게 모습을 보여 다오.
황급히 떠난 지도 두 달이 되었구나. 나의 페터야. 나는 계속 너의 뜻에
충실하련다. 너의 뜻이 무엇이었던가 잊지 않고 지켜가련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그것은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일이다. 네가 너의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했듯이 나도 나의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하련다. 나는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참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 나의 페터야. 제발 내 곁에 머물러 다오. 나에게 모습을 보여 다오.
캐테 콜비츠가 통한의 눈물로 만들어낸 <피에타>를 보면서 나는 바흐의
<마태 수난곡>에 나오는 한 아리아를 머리 속에 떠올렸다. <나의 하나님,
눈물로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알토 아리아다.

<마태 수난곡>에 나오는 한 아리아를 머리 속에 떠올렸다. <나의 하나님,
눈물로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알토 아리아다.

조반니 벨리니 피에타
바흐 마태수난곡 중 알토 아리아
"나의 하느님,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흐 마태수난곡 중 알토 아리아
"나의 하느님,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흐가 살던 시절, 독일의 여러 교회에서는 매년 성 금요일이 되면
그리스도의 수난을 소재로 한 수난곡을 연주했다고 한다. 수난 주간이 되면
다른 모든 음악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수난곡을 듣는 것이
유일한 음악행사였으며, 따라서 이 곡에 쏠리는 사람들의 기대도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라이프찌히 성 토마스 교회에서 칸토르(합창단 총감독)로 일하고 있던 바흐는
1729년 4월 15일 성 토마스 교회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
<마태수난곡>을 초연하게 된다.
<마태 수난곡>은 예수의 수난을 다룬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대한 음악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모두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에서부터 최후의 만찬, 예수의 예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거쳐 예수가 체포를 당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1부이고,
예수가 대제사장 앞에 서는 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과 유다의 죽음,
빌라도의 심판, 사형선고,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숨을 거두는 예수, 무덤에 묻히는
예수까지의 이야기가 2부에 해당된다. 바흐는 3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이 인류
최대의 드라마를 기악 반주를 동반한 합창과 독창, 중창으로 펼쳐 보였다.
모두 78곡, 전곡의 연주시간만 해도 세 시간에 달하는 대작인데,
성 토마스 교회에서 처음 연주되었을 때에는 중간에 목사의 설교와 기도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연주시간이 약 5시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태수난곡>은 흔히 종교음악의 하나로 분류된다. 하지만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다룬 이 인류 최대의 서사시에서 나는 신의 목소리보다는 인간의 목소리를 듣는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의 인간적인 고뇌와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와 그를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 인간 군상들...... 신과 인간, 성(聖)과 속(俗) , 영혼과 욕체,
믿음과 배신.... 어쩌면 예수 고난의 이야기는 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담고 있는
한 편의 휴먼 드라마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휴먼 드라마의 정점에
이 아리아 <나의 하나님, 눈물로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있다.
예수가 드디어 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예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예언한다.
하지만 베드로는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그렇게 비겁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드디어 예수가 체포되고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의 뒤를
몰래 따라간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가리키며 ‘저 자도 예수와
한 패였다’고 소리친다. 그러자 그는 황급히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기를 세 번, 드디어 닭이 운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는 예수의 예언을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린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순간을 ‘흐르는 눈물이 언제까지나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군중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적고 있다.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알토 아리아는 바로 이 장면 다음에 노래된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소재로 한 수난곡을 연주했다고 한다. 수난 주간이 되면
다른 모든 음악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수난곡을 듣는 것이
유일한 음악행사였으며, 따라서 이 곡에 쏠리는 사람들의 기대도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라이프찌히 성 토마스 교회에서 칸토르(합창단 총감독)로 일하고 있던 바흐는
1729년 4월 15일 성 토마스 교회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
<마태수난곡>을 초연하게 된다.
<마태 수난곡>은 예수의 수난을 다룬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대한 음악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모두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에서부터 최후의 만찬, 예수의 예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거쳐 예수가 체포를 당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1부이고,
예수가 대제사장 앞에 서는 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과 유다의 죽음,
빌라도의 심판, 사형선고,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숨을 거두는 예수, 무덤에 묻히는
예수까지의 이야기가 2부에 해당된다. 바흐는 3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이 인류
최대의 드라마를 기악 반주를 동반한 합창과 독창, 중창으로 펼쳐 보였다.
모두 78곡, 전곡의 연주시간만 해도 세 시간에 달하는 대작인데,
성 토마스 교회에서 처음 연주되었을 때에는 중간에 목사의 설교와 기도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연주시간이 약 5시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태수난곡>은 흔히 종교음악의 하나로 분류된다. 하지만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다룬 이 인류 최대의 서사시에서 나는 신의 목소리보다는 인간의 목소리를 듣는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의 인간적인 고뇌와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와 그를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 인간 군상들...... 신과 인간, 성(聖)과 속(俗) , 영혼과 욕체,
믿음과 배신.... 어쩌면 예수 고난의 이야기는 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담고 있는
한 편의 휴먼 드라마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휴먼 드라마의 정점에
이 아리아 <나의 하나님, 눈물로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있다.
예수가 드디어 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예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예언한다.
하지만 베드로는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그렇게 비겁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드디어 예수가 체포되고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의 뒤를
몰래 따라간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가리키며 ‘저 자도 예수와
한 패였다’고 소리친다. 그러자 그는 황급히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기를 세 번, 드디어 닭이 운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는 예수의 예언을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린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순간을 ‘흐르는 눈물이 언제까지나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군중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적고 있다.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알토 아리아는 바로 이 장면 다음에 노래된다.
나의 하나님.
눈물로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앞에서 애통하게 우는
나의 마음과 눈동자를 보시옵고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수난곡>을 처음부터 쭉 듣고 있다 보면 베드로가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바로
다음 장면에 이 곡을 집어넣은 바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느끼게 된다.
확실히 바흐는 작곡은 물론 음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극적 구성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한껏 부각시켜 놓은 다음에 ‘이 부족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의
아리아가 나오도록 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의 하나님>은 비탄에 찬 바이올린 전주로 시작을 한다. 애절하다 못해 처절한
느낌마저 주는 바이올린 오블리가토가 짙은 음영의 알토 아리아와 어우러지면서
<나의 하나님>은 처연한 슬픔의 비가(悲歌)가 된다. 여기서 바이올린은 단순한
반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알토 아리아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 곡은
바이올린과 알토의 2중주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만약 바이올린
오블리가토가 없었다면 이 곡의 처연함이 그토록 절실하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지나칠 정도의 처연함 때문에 나는 이 곡에서 인간적인 세속비가의
냄새를 맡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고뇌를 담은 세속 비가라고나 할까.
물론 종교음악에도 비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곡(聖曲)에서의 슬픔은
대부분 ‘절제와 성스러움’이라는 여과장치를 거쳐 승화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가. 그것은 케테 콜비츠의 <피에타>처럼
너무나 처절하고 적나라하게 통곡하고 절규하고 있다.
나는 감성적으로 이 두 작품 사이에, 아니 바흐와 케테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인간이
처한 어떤 상황을 말하고자 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감성으로 소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에타>라는 종교적인 주제를 전쟁의 비극과 같은 인간적인
주제를 형상화시키는데 이용한 케테나 <마태수난곡>이라는 종교적인 형식 속에
나약한 인간의 호소와 기도를 담은 바흐 모두 그렇다. 이들의 작품 속에서
성(聖)과 속(俗)은 비로소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아닐까.
<피에타>가 전시되어 있는 베를린의 그 넓은 홀에는 이 작품 하나만 놓여 있다.
천장 위에 뚫려 있는 동그란 구멍 바로 밑에 <피에타>가 놓여 있다. 천장의
구멍은 아마 채광과 환기를 위헤 뚫어 놓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사실 유럽에
가면 이런 건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곳 <피에타> 위로 뚫려
있는 구멍은 뭔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이 구멍을
통해 페터의 영혼이 승천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하기도 한단다. 그런데 나를
이 작품으로 인도한 동생의 말에 따르면 비가 올 때 바로 그 구멍을 통해
빗물이 들어와 <피에타>를 적신다고 한다. 비를 맞고 있는 <피에타>.
그 모습이 그렇게 처연할 수가 없다고...
이 얘기를 들으며 나는 또 다시 <피에타>를 <나의 하나님>과 대비시켜 본다.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비통한 어머니가 앨토 아리아라면, 그 위를 적시는 빗물은
바이올린 오블리가토가 아닐까. 그 빗물이 흘러 구석구석 에미와 아들의 옷자락을
적시듯, 바흐의 바이올린 선율은 우리 귀에 스며들어 감성의 구석구석을 적신다.
자료 / 진회숙 “클래식 오디세이” 중에서
다음 장면에 이 곡을 집어넣은 바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느끼게 된다.
확실히 바흐는 작곡은 물론 음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극적 구성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한껏 부각시켜 놓은 다음에 ‘이 부족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의
아리아가 나오도록 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의 하나님>은 비탄에 찬 바이올린 전주로 시작을 한다. 애절하다 못해 처절한
느낌마저 주는 바이올린 오블리가토가 짙은 음영의 알토 아리아와 어우러지면서
<나의 하나님>은 처연한 슬픔의 비가(悲歌)가 된다. 여기서 바이올린은 단순한
반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알토 아리아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 곡은
바이올린과 알토의 2중주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만약 바이올린
오블리가토가 없었다면 이 곡의 처연함이 그토록 절실하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지나칠 정도의 처연함 때문에 나는 이 곡에서 인간적인 세속비가의
냄새를 맡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고뇌를 담은 세속 비가라고나 할까.
물론 종교음악에도 비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곡(聖曲)에서의 슬픔은
대부분 ‘절제와 성스러움’이라는 여과장치를 거쳐 승화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가. 그것은 케테 콜비츠의 <피에타>처럼
너무나 처절하고 적나라하게 통곡하고 절규하고 있다.
나는 감성적으로 이 두 작품 사이에, 아니 바흐와 케테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인간이
처한 어떤 상황을 말하고자 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감성으로 소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에타>라는 종교적인 주제를 전쟁의 비극과 같은 인간적인
주제를 형상화시키는데 이용한 케테나 <마태수난곡>이라는 종교적인 형식 속에
나약한 인간의 호소와 기도를 담은 바흐 모두 그렇다. 이들의 작품 속에서
성(聖)과 속(俗)은 비로소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아닐까.
<피에타>가 전시되어 있는 베를린의 그 넓은 홀에는 이 작품 하나만 놓여 있다.
천장 위에 뚫려 있는 동그란 구멍 바로 밑에 <피에타>가 놓여 있다. 천장의
구멍은 아마 채광과 환기를 위헤 뚫어 놓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사실 유럽에
가면 이런 건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곳 <피에타> 위로 뚫려
있는 구멍은 뭔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이 구멍을
통해 페터의 영혼이 승천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하기도 한단다. 그런데 나를
이 작품으로 인도한 동생의 말에 따르면 비가 올 때 바로 그 구멍을 통해
빗물이 들어와 <피에타>를 적신다고 한다. 비를 맞고 있는 <피에타>.
그 모습이 그렇게 처연할 수가 없다고...
이 얘기를 들으며 나는 또 다시 <피에타>를 <나의 하나님>과 대비시켜 본다.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비통한 어머니가 앨토 아리아라면, 그 위를 적시는 빗물은
바이올린 오블리가토가 아닐까. 그 빗물이 흘러 구석구석 에미와 아들의 옷자락을
적시듯, 바흐의 바이올린 선율은 우리 귀에 스며들어 감성의 구석구석을 적신다.
자료 / 진회숙 “클래식 오디세이” 중에서
출처:http://blog.daum.net/jerom9401/10928900